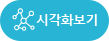| 항목 ID | GC05001986 |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문화유산/무형 유산 |
| 유형 | 작품/민요와 무가 |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 집필자 | 이병찬 |
| 채록 시기/일시 | 1989년 10월 11일 - 「잣 따는 소리」 이소라가 조순동에게 채록 |
|---|---|
| 채록지 | 「잣 따는 소리」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금동 2리 |
| 가창권역 | 「잣 따는 소리」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일대 |
| 성격 | 노동요 |
| 기능 구분 | 농업 노동요 |
| 가창자/시연자 | 조순동[1922, 남] |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잣을 따면서 부르는 노동요.
「잣 따는 소리」는 잣을 많이 생산하는 신북면에서 잣을 딸 때에 불리는 농업 노동요이다. 이때 불리는 「올라간다」 곡은 이 지역의 특색 있는 나무꾼 소리[올라간다-이요/ 올라하 가네/ 어덜떨 거리고/ 나 올라가노라]를 원용한 것이다. 「올라간다」는 가사의 나무꾼 소리 내지 풀나무 깎는 소리는 연천군 미산면 「울어리 소리」와 고흥군의 「산떨이」에도 있지만 이들과 곡이 같지 않다. 그러나 그 외의 「올라간다」나 파주군 적성면의 것과는 상관된다.
1989년 10월 11일 민요학자인 이소라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금동 2리로 현지 조사를 나가 주민 조순동[남, 67]의 창을 채록한 것이다
포천 민요의 음조직을 보면 무반음 전음계인 도레미솔라의 5음계 중에서 솔선법[솔라도레미]과 미선법[미솔라도레]이 주로 나타나고, 라선법과 도선법도 나온다. 영중면 김만수의 나무꾼 소리인 「올라간다」는 드물게 보이는 레선법이 쓰인다.
올러 가아하아안다 흐이/ 올라만 가-안다--/ 상상봉꼬-혹 대기로호/ 잣따러 올러만 가하--네.// 올라 갈젠/ 다리가 떨려/ 내려를 올적엔/ 숨이 차네.// 잣주어라/ 잣주어라/ 연에루 연방에/ 잣떨어진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서러를 마라.// 너는야/ 춘삼월 되면/ 다시나 피어서/ 오건마는.
포천 민요는 연천군, 가평군 및 중서 북부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강원도[원주 이북] 영향권에 있는 민요로서, 「포천 메나리」와 「조상맞이」 등을 통해 포천 지역민의 창의적이고 밝은 품성이 두드러진다.
현재는 잣 농사를 짓는 농가도 많이 줄었고, 「잣 따는 소리」도 ‘포천 메나리 보존회’에 의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더구나 잣을 수확하는 인부들이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전승은 더욱 어렵다.
포천에 메나리가 널리 알려진 것은 강원도의 영향이라 하겠으나, 「포천 메나리」를 통해 선율과 가창 방법 및 가사에 있어서 개성을 가미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조상맞이」, 「잣 따는 소리」가 채집되고, 경기도의 일반 상사형 「논맴 소리」에서 조금 벗어난 요소는 포천 민요의 창의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 공저, 『구비 문학 개론』(일조각, 1971)
- 『포천 군지』 (포천 군지 편찬 위원회, 1997)
- 강등학 외 공저, 『한국 구비 문학의 이해』(월인, 2002)
- 『포천의 민속』 (포천 문화원, 2010)